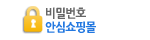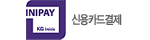- | 상품 상세 설명
![]()
“우하야.”
겨우 이름 하나. 네 이름 하나를 뱉어내고 입이 다시 닫혔다.
나는 참담해, 도저히 너와 눈을 맞추고 있기가 어려워 고개를 숙였다.
“민욱 씨는 내가 죽으면 슬플 거 같아요?”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는 삶에 지쳐 떠나 버린 여자, 장우하.
“장우하 네가. 우산 하나 없는 몸으로 그 날비를 다 맞고 있잖아, 네가.”
너를 잃었지만 잊는 건 못 하겠어.
다시 네 곁에 머무르고 싶다.
떠난 사랑이 마음속의 그리움이었음을 알아 버린 남자, 권민욱.
네 이름을 닮은 계절에 너를 잃었고
네 미소를 닮은 시간에 너를 다시 만났다.
나와 너는, 우리는, 아팠던 이 계절을 넘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여름의 상흔을 닮은 두 사람의 이야기.
![]()
임이현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연재카페 cafe.naver.com/chocholyh
블로그 blog.naver.com/chocholyh
트위터 @chocholyh
-출간작-
서주의 강에 살다
수연아,
![]()
“이혼한 거 자체가 문제라면 혼인 신고 다시 해.”
“왜 어린애같이 이래요. 지리멸렬한 실랑이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민욱이 우하 뒤로 나 있는 창을 건너다보았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창은 우하에게도 민욱에게도 공평히 그날을 떠오르게 했다. 한 사람은 수의를 입고 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놀란 가슴을 부여잡았던 그날.
“우하야. 그 생일 선물 받고 기뻤어?”
변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던 민욱의 모습이 언뜻 스쳤다.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은 채로 억겁의 시간을 견뎌 내는 것만 같던 모습이 우하의 가슴을 비참하게 그었다.
“나는 안 기쁘더라.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 생일 선물은 주는 사람이 기뻐야 받는 사람도 기쁘다던데, 나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이런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민욱 씨, 우리 아버지 아니더라도 어머님한테는 어쩌게. 그냥 민욱 씨 편할 수 있는 대로 살아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민욱이 우하를 감쌌다. 이 사람도 힘들어요. 병원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고생시키면 어떻게 견뎌요. 집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시키게 하냐고요. 그렇게 따져 묻던 민욱에게 시어머니는 호통 대신 숟가락을 던졌다.
날아온 숟가락이 정확히 그의 왼쪽 눈두덩에 박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병원 나가 돈 벌어 오라고 했니? 아니면 내가 기어이 병원 나가라 떠밀었니? 너희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뒀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아침 댓바람부터, 그것도 밥상머리에서 들어야 하지? 잘 들어라. 우하 너는 이 집에 사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물건으로 들어온 거야. 물론 내 아들도 네 아버지한테 물건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 입 가볍게 놀리지 말고 살아. 베갯머리송사로 네 남편 구워삶지도 말고. 물건은 원래 말을 하지 못한다. 꼭 명심해라.
그날 민욱의 눈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한 달을 가까이 민욱은 안대를 쓰고 출퇴근을 해야 했다. 시어머니의 날 선 행동은 항상 바늘이 되어 민욱을 찔렀다. 그런 식의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네가 하는 내 걱정 사절이야, 이제.”
“민욱 씨.”
“선은 되도록 지킬게. 대신 치료부터 다시 받으러 다녀.”
“받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도 그만해. 안 받는 거 빤히 알고 하는 소리니까.”
알고 있었구나. 어리석은 거짓말이 관통당하는 일은 썩 유쾌하지 않았다.
“치료는 어쩌자고 안 받아? 다리 아플 거잖아.”
“진통제 먹어요. 병원 일도 바쁘고, 그래서…….”
“의사한테 가면 행여나 소문날까 봐 사리는 건 아니고? 내가 이혼하고도 치료받으러 다니랬잖아. 의사 입단속시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다니는 줄 알았어. 나랑 같이 다니던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네가 아는 의사한테 치료 잘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더라, 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 너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아버님한테 내 목줄 쥐여 줄 참이니까.”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려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쥐면 그건 온전하지 못했다. 자신만 봐도 그러니 결과가 어떨지 당연했다. 종진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파악하기 어렵고 간사하고 그러면서도 선한 부분이 있어 무어라 단정 짓기 어렵다.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종진에게 목줄을 잡힌 사람은 약점이 다 바닥날 때까지 이용당한다는 사실이다.
“민욱 씨, 제발.”
“미안하게 생각해. 부탁하면서 이렇게 협박처럼 하는 거.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넌 내 말 안 들을 거고, 난 이제 손 놓고 있기 싫어.”
민욱이 우하의 손에 숟가락을 쥐여 주었다.
“밥 마저 먹어.”
그러나 우하는 밥을 뜨지 못했다.
“우리 그런 거 없잖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없는 사이잖아.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서 결혼했고, 하고 싶어서 이혼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 그래, 없었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앞으로 쭉 없으리란 법 없고, 지금 당장에 나는 네가 자꾸 걸려. 이게 살아온 정인지 의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장에 내 속에 체증처럼 네가 걸린다고. 참으려고 했어. 그래서 이혼하고부터 너한테 연락 한 통 안 했고. 그런데 네가 잘 못 지내고 있잖아.”
민욱이 두 눈을 지르감고 식탁 위에 둔 손을 악쥐었다.
“네가, 장우하 네가, 날비를 다 맞고 서 있잖아. 우산 하나 없는 몸으로 그 날비를 다 맞고 있잖아, 네가.”
마음 주지 않으려 애를 썼다. 끝내게 될 일이 생긴다면 미련도 없이 돌아설 수 있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다. 하지만 마음이란 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몸을 섞었다.
그렇게 쌓아진 6년의 세월은 이혼 서류 하나만으로 정리되지 못했다. 그게 지금의 발 담근 현실이었다.
사실 그날 예감했다. 이혼하고 연락도 없던 사람이 알려 주지도 않은 우영의 장례식에 찾아온 날. 종진에게 대서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삼일장을 지내는 내내 옆에 있어 주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아직 나에게 남은 정이란 게 있구나, 아직도 내가 가엽게 보이는 거구나, 그렇게 예감했고 그건 여지없이 사실이 되었다.
살갑던 윤을 베어 내지 못했듯, 이번에도 여전하다.
그래서 윤을 잃었으면서.
윤을 사지로 내몰았으면서.
눈에서 습기가 차올라 장맛비가 된다. 무섭다. 무서워 견딜 수가 없다. 울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얼굴을 가리고 수치스럽게 떨었다.
“내가 너한테 진 빚 갚는 거라,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낙원 같은 말이 주어진다.
그게 얼마나 의지하고 싶은 말인지,
그게 얼마나 기대고 싶은 말인지,
당신은 알고나 하는 걸까.
우하는 빗소리에 묻혀 엉엉 울었다. 모든 소란한 울음이 몸에서 뽑힐 때까지. 그래서 빗소리와 함께 자신이 씻겨 내려가기를. 이 세상에 장우하, 라는 이름 세 글자조차도 없게 사라지길 바랐다.

- | 상품 문의

- | 상품 후기


 이미지 크게 보기
이미지 크게 보기